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WRITER : 야망백수
퇴사할 땐 하고 싶은게 참 많았다. 매일 만화도 그리고, 내 브랜드도 런칭하고, 글도 꾸준히 써서 그걸로 먹고 사는 멋진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 했었다. 1년 뒤, 하려 했던 것들을 조금씩은 다 건드려보긴 한 것 같긴 한데 결과는 영 신통찮다. 나는 과연 성장했나. 성장했다고 말하려면 이전엔 몰랐던 것,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나는 되려 이전만 못 한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든다. 멈춰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멀리 온 것 같지도 않고. 출정과 퇴각을 번갈아가며 어지러운 발자국만 남긴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얻은 게 아주 없진 않다. 이런 저런 툴들을 조금 더 잘 만지게 되었다. 몇십 개의 SNS 게시물이 남았다. 두세 개의 프로젝트가 남았다. <풀칠>도 남았다. 하지만 이것들을 뜯어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룬 것들은 어쩌면 부지런한 직장인이 연차를 붙인 주말 서너 번으로 이룰 수 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언제나 나를 깊은 불안에 빠트린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남들에겐 그저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이란 이름으로 열정을 증명하고 돈을 벌어내는 바람직한 취미활동에 불과하다는 생각. 내 생각에 이건 진지해질수록 무능해지는 게임이다. 가볍게 시도하라는 조언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걸 보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자꾸만 진지해지고만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생산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쉽게 떠오르는 진부한 이야기는 미뤄두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길 만들어내고 싶기도 하다. 부끄러움 없이 나 자신을 창작자로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려구요”에서 “창작자가 되어 보려구요”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어쩌면 1년 동안의 유일한 성과인지도 모르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창피하지 않은데, 내 맘에 드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건 왜 이렇게 머쓱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물론 나를 먹여살릴 돈을 벌어야하므로 일을 하고 있긴 하다. 내 일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때려쳐도, 당장 돈 벌기엔 역시 남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니까. ‘시켜만 주시면 무엇이든!’을 외치며 잡식성 프리랜서로 많이 일하고 적게 벌고 있다. 남들은 퇴사하고 잘도 ‘월천’을 찍는다던데...나는 딱 굶어죽지 않을만큼만 번다.
통장잔고가 유난히 성에 안 차는 날엔 ‘나는 이렇게 월 천만원을 벌었다’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다. 부지런히 스스로를 포장해서 실제보다 더 대단해 보일 수만 있다면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어쩌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치인지도 모른다. 나도 몇몇 방법은 직접 찍어 먹어보기도 했다. 해시태그(#퍼스널브랜딩)도 열심히 달고, 유튜브(흑역사로 남을)도 해봤다. 해보고 나서야 알았다. 난 나를 밑천으로 쓰는 걸 그닥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싶은 일을 크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이걸 깨달은 것도 나름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눈에 확 띄는 성취도 없다. 하지만 아직 관두고 싶진 않다. 준비도 없이 1년 만에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오만이라고, 자기합리화를 시전할 여유도 약간은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위안이 되는 것은 언제 겪어도 겪었을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매일이 불안하긴 하지만 후회가 남진 않는다. 계속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결국엔 지난 모든 선택을 옳은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감도비

야망백수님의 이번 글을 읽으며 ‘건조한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자기애가 지나치면 글에서 축축한 쉰내가 날 때가 있잖아요. 장마철 빨래에서 나는 그런 거요. 야망백수님의 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랄까, 건조기에서 갓 꺼낸 마음 같달까요. 많은 시간과 경험과 고민의 산물이겠죠. 지나온 궤적을 덤덤히 돌아보는 야망백수님의 모습에서 그동안 수없이 자신의 목표와 현실을 견줘본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해보고 나서야 알았다. 난 나를 밑천으로 쓰는 걸 그닥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이나 ‘돈을 많이 벌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창피하지 않은데, 내 맘에 드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건 왜 이렇게 머쓱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같은 문장들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경작의 순서와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텃밭에서 제철 과일을 땄고 누군가는 한 마지기 땅에 이제 벼를 심죠. 제가 본 야망백수님은 꾸준히 땅을 넒히는 사람이에요. 평야를 모두 일궜는데 월천? 월억을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아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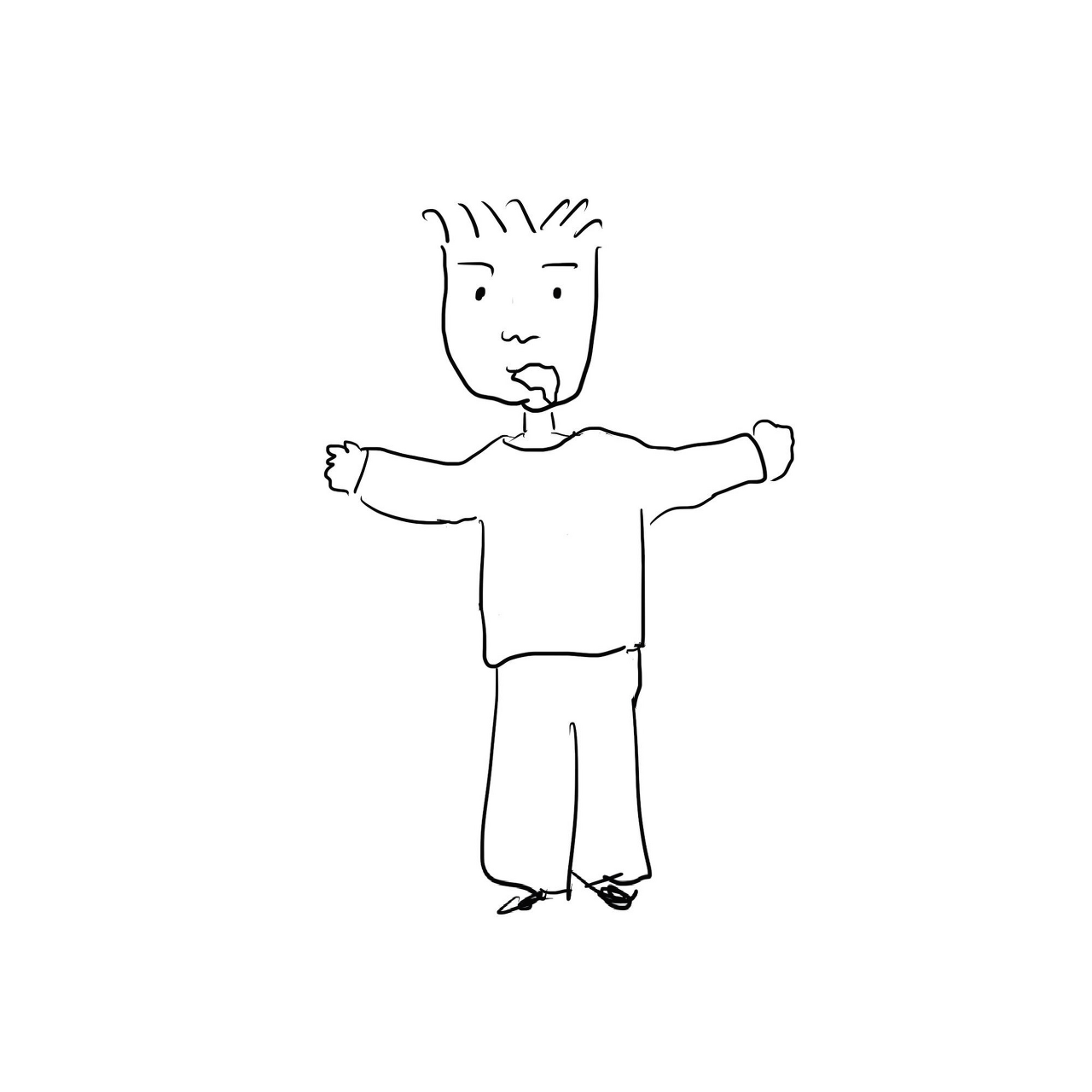
풀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의 시제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먹은 것’은 이미 소화되어 내 몸의 일부가 되었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어야 하루를, 아니 겨우 대여섯 시간에 불과한 끼니와 끼니 사이를 살죠. 아! 굶지 못해 슬픈 짐승이여. 타고난 불안의 왕이여!
“인생은 같은 공간을 반복하는 회전이 아니라 나선형의 삶이 아닐까. 빙글빙글 도는 듯 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듯 하지만 사실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빗겨 나가고 있는거야.”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각자의 중심에서 시작해 저마다 다른 형태로 그리는 나선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손가락 끝의 지문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말이죠. 좀 어지럽지만, 어쩔 수 없죠. 자신을 믿고 킵고잉-해봐요, 우리.
파주

얼마 전 세포의 노화와 운동부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망가져 가는 몸을 체감하면서, 문득 제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흐르는 방향(OO살)이 아니라 여생을 가늠하는 D(eath)-DAY 계산법으로 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화수분처럼 한없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 인생이 무한리필 되는 싸구려 돼지고기집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상기시키려는 시도였죠.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니 욕망이 더 분명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성공하고 싶다'라는 저의 입버릇 안에 내재돼 있는 건, 명예욕 따위가 아니라 '좋아하는 걸 더 신명나게 하고 싶다'는 하찮은 욕망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결국 죽기 전에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성취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고작 일 년 만에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던 야망백수님께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밥벌이 에세이 풀칠 구독하기
잘난 거 없는 우리가 전하는 근근히 먹고 사는 이야기. 매주 수요일 밤 10시, 평일의 반환점에 찾아갑니다.
page.stibee.com
'밥벌이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비에게도 계획이 있다 [밥벌이 에세이] (0) | 2021.08.13 |
|---|---|
| 약간 어긋난 사람들 [밥벌이 에세이] (0) | 2021.08.13 |
| 저도 트윈헤드-휴먼이 되고 싶어요 [밥벌이 에세이] (0) | 2021.08.13 |
| 월루의 미학 [밥벌이 에세이] (1) | 2021.08.13 |
|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세요 [밥벌이 에세이] (1) | 2021.08.13 |




